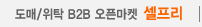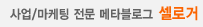-

[비공개] 두바이#5. 헐벗은 두바이, 옮겨심어진 꽃들.
두바이 시내를 돌아보며 심심찮게 부딪혔던 '물차'. 식수로 마실 수 없는 짠물이 아니라, 식용이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sweet water'를 운송하는 차들은 한국의 유조차에 비길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유조차, 두바이의 식수차. 무슨 카레이싱 트랙처럼 하얗고 꺼멓고 번갈아가며 칠해진 보도블럭도 눈에 띄었지만, 그야말로 앙상하다는 느낌 그대로 듬성듬성 뜯겨진 머리칼처럼 빨강노랑꽃들이 피어난 화단이란 참. 자세히 보면 물을 공급하는 호스가 요리조리 보일러 배관처럼 화단을 커버하고 있고, 그 근처에 바싹 붙어선 운좋은 몇몇의 식물들만 꽃봉오리까지 피워낼 수 있었던 거다. 아마도 쉴새없이 저 호스로 쫄쫄쫄 물을 공급하면서 겨우 꽃들을 보듬고 있겠지. 그럴듯한 외관을 갖춘 건물 옆을 지나. 어디선가 옆에 바싹 붙어섰던 버스는 뿌연 ..추천 -

[비공개] 두바이#4. 웃자란 두바이, '한탕주의식' 경제발전 모델의 귀결 버즈..
버즈알아랍. '버즈'는 탑이란 뜻의 아랍어다. 아랍의 탑.저 꼭대기 헬기착륙장에서던가타이거 우즈가 멋진 티샷을 선보이던 광고를 찍었노라고 가이드가 설명했다. 돛단배를 형상화한 버즈알아랍, 호텔 수준을 구분하는 별 몇개짜리 등급으로 치면 사실 오성등급 이상으로 공인된 건 없지만 자타공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자부심으로 무려 '세계 유일의 칠성급 호텔'이라 선전하고 있는 곳이다. 이전에는 입장료를 따로 받고 호텔 내부를 구경하는 호텔 투어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하루 방값이 최소 백오십만원 정도 된다는 이 곳에서 묵는 건 그다지 내게 있을 법 하지 않은 일인지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구경해볼 수 있냐고 했더니 레스토랑을 이용하면 된단다. 한끼에 이십여만원한다는 식사를 하면 된다고 하..추천 -

[비공개] 두바이#3. 광화문 광장의 화단 vs 두바이 사막의 잔디.
버즈 두바이를 바라보기 가장 좋다는 맞은편 쇼핑센터, 시간이 너무 일러 대부분 문이 닫힌 상태였지만, 높이 솟은 건물들과 함께 잘 정돈된,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분수정원이 두바이의 급격한 축재를 잘 나타내주는 듯 하다. 이 메마르고 황량한 도시에 저런 분수대라니. 대개 모든 건물들이 지은지 얼마 안된, 갓 구워진 쿠키처럼 노르스름한 황토빛이다. 그래서인지 왠지 테마파크 같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조금씩 동이 터오는 하늘, 좀더 뜨겁게 땅이 달구어지고 그림자가 두껍고 짧아지면 이 곳의 풍경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너무 휑하다. 사람은 없고 풍경만 있다. 두바이가 최근의 모라토리엄 사태를 거치면서 곤욕을 치르고는 있지만,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 혹은 중동이 가진 핵심 전력..추천 -
[비공개] [닌자어쌔신] 핏빛 아름다움에 못미친 채 너덜너덜 걸레가 되어버린 레인.
속이 메슥거릴 정도로 선혈이 낭자했다. 실감나게 토막나버린 팔다리는 말할 것도 없이, 동강난 머리통과 허리째 베여나가 무슨 햄덩어리같은 인체의 신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중에는 그냥, 영화배우 '레인'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썰려나가는 적들의 몸뚱이를 보면서 정육점의 전동회전칼이 생각났다. 윙~ 소리나는 그것에 큼직한 고기를 갖다대면 살이고 뼈고 거침없이 썰려나가는. 아, 물론 약간의 김칫국물이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효과와 외마디 비명소리 정도는 추가되어야겠지만. 액션 영화의 스토리란 거야 뭐, 뻔하니까 딱히 기대하는 것도 없었지만 영화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건 딴 생각이었다. 이 영화에 비, 혹은 레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나 욕구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관객들, 최소한 국내 관..추천 -

[비공개] 캄보디아#10. 뚝뚝 운전수 아저씨의 콧노래.
이 소리는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사원군의 꽃인 '반띠아이 쓰레이'로 향하는 뚝뚝을 운전하는 '청'이 부르는 콧노래입니다, 라는 식으로 소개하고 싶었는데. 온통 바람소리 뿐이다. 앙코르왓 중심부에서 한 40킬로미터를 달려야 나오는 그곳, 마침 정오에 가까운 시각이라 지글거리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 위에는 우리 밖에 없었더랬다. 청이 뒤집어쓴 헬멧이 고작 한뼘도 안되는 그림자만 짙게 드리우는 중천의 태양, 오토바이가 거스르며 달리는 바람조차 뜨거웠던 그 때. 뼈에 추위가 저며드는 때가 아니라 해도 무시로 떠오르는 행복한 기억. //추천 -

[비공개] 캄보디아#9. 프놈펜 신호등엔 달리는 사람이 있다?
앙코르왓이 있는 씨엠립에선 신호등 같은 거 신경도 안쓰고 다녔는데, 역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좀더 교통체계도 잡혀 있고 무단횡단도 함부로 하면 안 될 분위기였다. (그치만 내가 알기론 여전히 캄보디아에는 교통관련법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 프놈펜에서 몇 차례나 내 앞에서 번쩍이며 제자리뜀을 즐기던 녀석, 한국처럼 빠르게감기로 돌아가는 초시계가 아니라 캄보디아스럽게 여유로운, 아마도 느리게감기중인 듯한 초시계도 인상적이었다는. //추천 -

[비공개] 저녁밥 대신 술 한잔.
어제 배철수가 그랬던가, 비오면 비온다고, 추우면 춥다고, 어떤 핑계든 대고 찾는 게 술이라고. 그렇게 비온다고, 눈온다고, 밤이라고, 춥다고 찾는 게 또 하나 있으니 음악이라고 했다. 그래서, 음악과 술은 언제 어느때고 내키면 꺼내들 수 있는 창과 방패인 듯 하다. 부드러운 음악으로 실드치고 톡 쏘는 술로 찌르기 들어가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 저녁밥으로 술을 마셔버렸다. 아 무슨 술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공부가주 마시고 야근중..) //추천 -

[비공개] 달콤한 게 필요할 때, Baileys.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만 가끔은 마끼아또같은 달콤한 게 땡길 때가 있다. 독한 술을 좋아하지만 또 가끔은, 술 같지도 않은 달콤한 리큐어가 땡길 때도 있다. 한잔 한잔 홀짝대다 보면 뭔가 그럴듯한 아이스 피커와 커다란 아이스덩어리가 갖고 싶어지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서 얼추 느끼함이 분별될 즈음 병이 비워지곤 한다. 집에서 마실 때의 원칙은 주종을 하나로만. 병이 비면 술도 그만인 거다. //추천













 1510개
1510개 1052227개
1052227개 718032개
718032개